Neuroscience Study
창의성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본문
사회적 관계에서 탄생하는 창의성

F. 스콧 피츠제럴드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파리에서 친구가 된 가난한 젊은이들이었다. 팝아트 작가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20대 때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던 화가 사이 톰블리, 재스퍼 존스와 로맨틱한 관계였다. 20대 때의 메리 셸리는 동료 작가 퍼시 비시 셸리, 바이런 경과 함께 보낸 여름에 대표작 《프랑켄슈타인》을 썼다. 왜 창작자들은 이처럼 서로에게 끌리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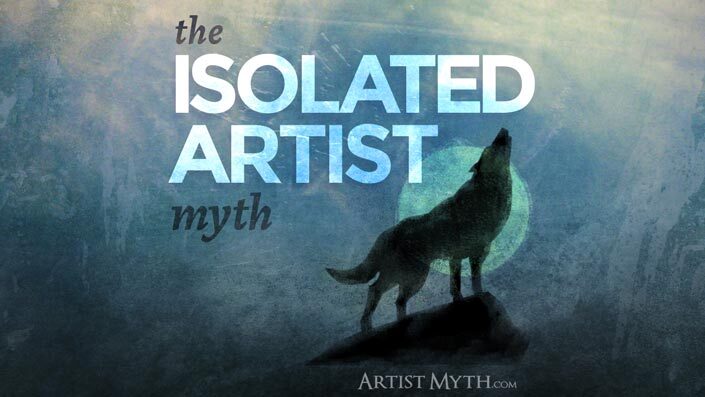
창의적인 예술가는 세상과 등질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믿음이 퍼져 있지만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 작가 조이스 캐롤 오츠는 1972년에 쓴 수필 《고립된 예술가를 향한 오해The Myth of the Isolated Artist》에서 이런 말을 했다.
"예술가가 일반 사회와 고립된 인물이라는 건 잘못된 믿음이다. (…) 전통 로맨스에서 비극적인 괴짜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예술가 역시 지극히 평범하고 사회생활도 활발히 하는 개인이다.”
포부가 있는 창작자에게 돌봐주는 사람이나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고 도움과 용기를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늘 자신의 동료들과 떨어져 고립된 생활을 하는 예술가는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괴물이다. 창의력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외로운 예술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살아생전 그는 예술가로서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고 그림도 별로 팔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료들과 잘 지낸 예술가의 면모가 엿보인다. 그는 여러 젊은 예술가나 다른 화가를 솔직히 비판한 내용과 미술 얘기가 담긴 편지를 주고받았다. 화단에서 처음 좋은 평을 받았을 때는 그 비평가에게 선물로 상록수를 보내기도 했다. 한때는 폴 고갱과 함께 열대 지방에 화가촌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반 고흐가 철저히 고립주의자였다고 말하는 걸까? 그것이 그가 보여준 천재성의 근원을 설명해주는 얘기로 제법 그럴싸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반 고흐는 부적응자도 외톨이도 아니었고 자신의 시대에 적극 참여한 인물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예술가뿐 아니라 창의적인 발명을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미국 사회 생물학자 에드워드 O. 윌슨은 이런 글을 썼다.
"외딴 연구실에서 홀로 연구하는 위대한 과학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과학자가 자신은 홀로 고독하게 연구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상호 의존적인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인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도 보다 규모가 큰 창의적인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의 지성인 아이작 뉴턴은 연금술을 터득하는 데 자기 삶의 상당 부분을 바쳤다. 그의 시대에는 연금술이 굉장히 주목받는 분야였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우리는 서로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쉼없이 애쓴다. 친구가 당신에게 오늘 무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늘 같은 대답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과연 그 우정이 오래 지속될까? 그래서 인간은 좋은 의미에서 서로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애쓴다. 인간은 서로에게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고 그것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다.
어쩌면 컴퓨터는 그다지 창의적인 제품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튼 컴퓨터는 전화번호든 문서든 사진이든 집어넣은 그대로 되돌려주며 그 능력은 우리의 기억력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지만 그 정밀성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가령 농담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친절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영화를 감독하거나 TED 강연을 하거나 사람을 울리는 소설도 쓰지 못한다. 창의력을 갖춘 인공 지능을 만들려면 모두가 서로를 놀라게 하려 애쓰고 서로에게 감동을 안겨주고자 하는 탐구형 컴퓨터들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컴퓨터에는 그런 사회적인 면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인공 지능 컴퓨터를 만드는 게 그토록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창의성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척색동물 멍게는 기이한 행동을 한다. 어려서는 헤엄쳐 다니다가 결국 따개비처럼 붙어 있을 장소를 찾고 나면 영양분 섭취를 위해 자신의 뇌를 흡입한다. 왜 그럴까? 영구적인 집을 발견한 까닭에 더 이상 뇌가 필요 없어서다. 멍게의 뇌는 정착할 장소를 찾고 그곳에 정착할 결심을 하는 데 필요할 뿐이며 그 임무가 끝나면 뇌의 영양소를 다른 장기로 보낸다. 한마디로 멍게의 뇌는 무언가를 찾고 결정하는 데 쓰인다! 어떤 장소에 정착하는 즉시 뇌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인간은 하루 종일 소파에 들러붙어 감자칩을 먹으며 TV만 보는 게을러빠진 사람조차 자기 뇌를 먹지는 않는다. 인간에게는 멍게 같은 최종 정착지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늘 틀에 박힌 일상을 거부하려 안달하며 인간에게 창의력이란 생물학적 지상 명령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예술과 기술 분야에서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해주는게 아니라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것이다. 그 결과 기발한 상상력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특징 중 하나다. 그렇게 우리는 복잡한 서식지를 구축하고, 많은 요리법을 개발하고, 시시각각 다른 옷을 입고, 정교한 언어로 의사소통하고, 직접 만든 날개와 바퀴를 이용해 서식지 안에서 이동한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창의력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혁신은 필수다. 그것은 일부 소수만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인간의 뇌 속에는 혁신의 원동력이 있고 되풀이되는 일상에 맞서는 행동을 토대로 이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번 10년에서 다음 10년으로, 이번 해에서 다음 해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 중 일부다. 우리는 그렇게 수백 개의 문화,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돼지, 라마, 금붕어와 달리 인간은 지금 예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데이비드 이글먼. (2019). 창조하는 뇌 (엄성수, 역). 서울: 쌤앤파커스.
'Neuroscience Book > Creativ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창조하는 뇌의 세 가지 전략: 휘기, 쪼개기, 섞기 (0) | 2022.12.15 |
|---|---|
| 인간의 창의력은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2) | 2022.12.14 |
| 동물적 감각과 고도의 창의성 (0) | 2022.12.13 |
| 익숙함과 낯섦 사이 (0) | 2022.12.13 |
| 왜 완벽한 스타일을 찾지 못하는가? (0) | 2022.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