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uroscience Study
의욕과 열정의 행복물질, 도파민 본문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쟁취해 손에 넣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분비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참으로 무미건조한 이야기지만 ‘도파민 분비는 곧 행복’이라는 말이다. 덧붙이자면 ‘행복해지는 방법 =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도파민은 ‘행복물질’이라고도 불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리는 행복에 젖는다. 참고로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된다. 목표를 세울 때 마음이 들뜨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도파민은 중뇌의 복측피개 영역VTA, Ventral Tegmental Area에 있는 ‘A10’이라는 신경핵에서 생성된다. 도파민은 복측피개 영역에서 주로 두 경로를 통해 분비된다. 해마가 있는 대뇌변연계에 투사하는(투사신경섬유가 연결되어 있다.) 중뇌변연계와 전두엽과 측두엽에 투사하는 중뇌피질계다. 도파민은 축색돌기를 따라 각 부위로 이동하다가 축색돌기 끝(말단)에 있는 시냅스에서 방출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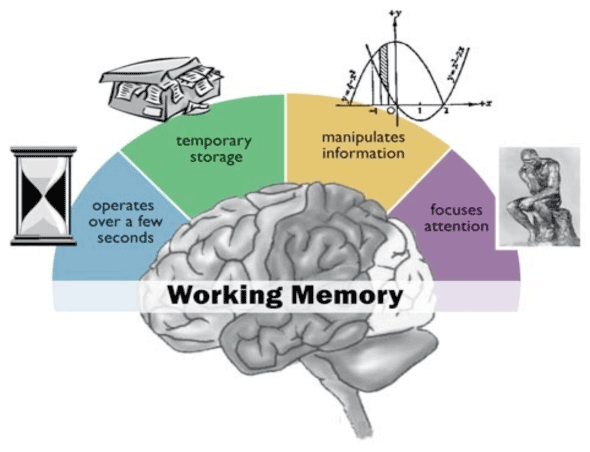
예를 들어 도파민은 전두엽 앞쪽에 위치한 전두연합령의 ‘워킹메모리(작업기억)’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도파민 분비는 정보처리능력, 주의집중력, 계획성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한편, 해마와 측두엽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도파민이 분비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기억력이 향상된다.

A10에서 생성되는 도파민 신경계는 욕구가 충족되었거나, 충족되리라고 예상될 때 활성화되고, 쾌락을 느끼게 한다고 해서 ‘보수계’라고 불린다. 그리고 보수계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뇌변연계의 ‘측좌핵Nucleus accumbens’이라는 부위다.
측좌핵을 자극하면 그 즉시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감’이 느껴진다. 이 ‘쾌감’과 ‘행동’이 하나로 묶여, 더 강한 쾌감을 얻기 위해 그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화된다. 이것이 보수계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도파민은 인간의 학습,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 환경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더 많은 쾌감 = 더 많은 도파민’을 위하여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쳐다보는 존재다.
‘보수 사이클’을 크게 돌려라
의욕이나 동기는 측좌핵이 흥분했을 때 높아진다. 또한 측좌핵의 ‘뉴런’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자극’을 받으면 흥분한다. 재미있거나, 기쁘거나, 어떤 일을 달성해 성취감을 느끼거나, 칭찬받거나, 사랑받는 것. 그런 정신적인 보상을 얻으면 측좌핵의 뉴런이 흥분한다. 누구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일할 마음이 나지 않는 법이다. 뇌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뇌에 의욕이 생기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보상을 주면 된다. 보상과 도파민 분비의 관계는 사이클 형태다. 그 결과 행동과 쾌감이 연결된다. 특정한 행동을 하면 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뇌가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쾌감을 얻고 싶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게다가 두 번째 행동에서는 전보다 더 큰 쾌감을 얻고자 ‘연구’를 한다. 결과적으로 더 큰 쾌감을 얻는다. 그러면 세 번째에는 두 번째보다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쾌감을 얻기 위한 창의적 연구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당연히 그 사람은 점점 발전한다. 이 일련의 사이클을 도파민의 ‘강화학습’이라고 한다.
도파민계가 담당하는 강화학습 구조는 인간이 동기부여를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성장, 진화하는 데 불가결한 뇌 내 시스템이다. 테크놀로지가 이렇게나 고도로 발전했는데도 인류가 끊임없이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강화학습과 연관이 있다.
2022.12.10 - [Neuroscience Book/Neuroscience] - 보상체계가 뇌의 엔진이다
보상체계가 뇌의 엔진이다
ADHD 진단 기준에 많은 사람이 씨름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집중력에 문제는 있지만 ADHD로 진단이 나올 정도는 아닌 사람에게 약 복용 말고 도움이 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ssetogosilliconvalley.tistory.com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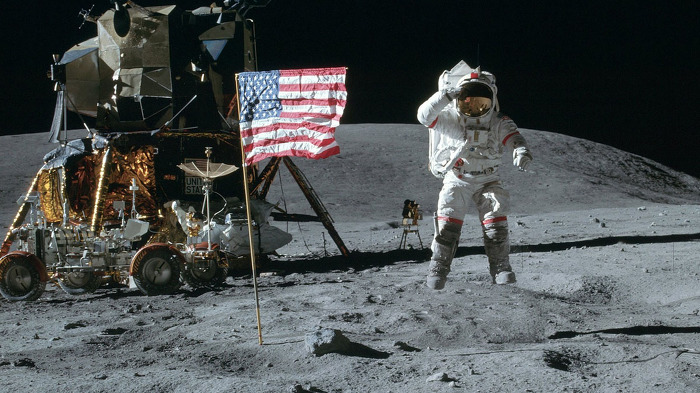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표면에 착륙했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 유명한 말을 업무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위대한 도약’을 위해서는 처음의 ‘작은 한 걸음’이 중요하다. 최소한 앞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다음 걸음을 떼려는 의욕이 생긴다.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위대한 도약이 실현되는 것이다. 일단 작은 한 걸음, 즉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자.
'힘들다'를 '즐겁다'로 바꿔주는 리프레이밍

목표를 달성한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해보자!', '노력하자!'는 의욕이 넘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노력하다 보면 아무리 즐겁게 노력하려고 해도 괴롭고 힘든 국면이 닥치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생각을 바꾸어 힘든 일을 즐겁게 실행하자. 사물을 바라보는 틀을 전환하는 '리프레이밍reframing'이라는 심리기법을 이용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같은 일도 사람에 따라 견해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보면 장점인 일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단점이 될 수 있다.
시험시간이 15분 남았다고 치자.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네.'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15분이나 남았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아직 15분이나 남았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괴로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리프레이밍을 하려면 평소에 연습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이나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즉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그 표현을 소리내어 말해보자.
리프레이밍으로 '불쾌감'을 '쾌감'으로 바꿀 수 있으면 같은 일을 해도 효율과 결과물의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칭찬은 타이밍이 관건, 남발해도 곤란

칭찬은 아주 큰 심리적 보상이다. 칭찬을 받았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실험으로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남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칭찬해주자.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뇌에게는 훌륭한 상이 된다. "좋아!", "잘했어." "드디어 해냈네!", "이만큼이나 했구나.”, “진짜 대단해.", "이렇게 빨리 하다니 짱이야." 이렇게 혼잣말처럼 소리 내어 말해보자. 남들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볼지도 모르지만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되어 뇌에 상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도파민을 분비하려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칭찬해야 효과가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남을 칭찬할 때에도 타이밍이 관건 아닌가? 팀원이 좋은 결과를 냈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제대로 칭찬해주자. 칭찬은 팀원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하는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목표는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자 '다소 힘든 목표'이기 때문이다. 같은 높이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는 칭찬은 별 의미가 없다. 계단 한 층을 끝까지 올라갔을 때, 즉 수준이 올랐을 때 칭찬하는 것이 좋다. 게임에 빗대어 말하자면 레벨업을 알리는 음악이 나오는 순간이 칭찬효과가 극대화되는 절호의 기회다. 송사리급 괴물을 쓰러뜨릴 때마다 칭찬하면 칭찬의 효과는 점점 약해질 뿐이다.
가바사와 시온. (2018).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오시연, 역). 서울: 쌤앤파커스.
'Neuroscience Book > Neuroscie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중력과 기억력을 끌어올려야 할 때, 노르아드레날린 (2) | 2022.12.28 |
|---|---|
| 행복물질이 넘쳐 나오는 목표달성 7단계 (0) | 2022.12.28 |
| 인생을 바꿔줄 7가지 기적의 물질 (0) | 2022.12.27 |
|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2) | 2022.12.17 |
| 운동이 왜 집중력을 향상할까? (2) | 2022.12.12 |




